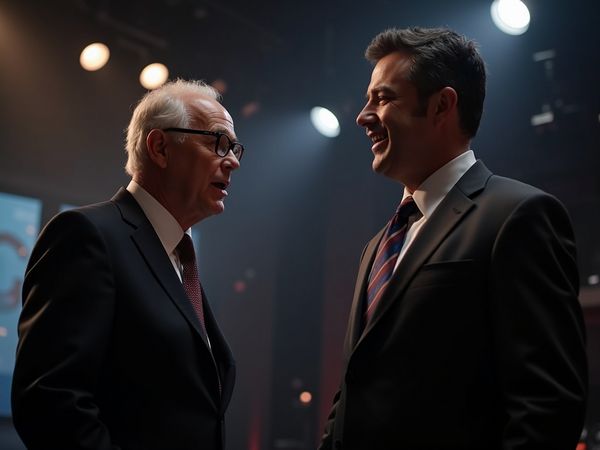뉴욕 월가에 ‘차익 실현’ 바람이 불면서 미국 주식형 펀드(Equity Funds)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자금이 유출됐다.
2025년 9월 19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9월 17일까지 한 주 동안 순 431억9,000만 달러를 회수해 2024년 12월 중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랠리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가 촉발한 고평가 우려가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S&P 500 지수는 4월 7일 장중 저점(4,835.04) 대비 37.7% 급등해 6,656.8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한 급등세 속에 투자자들은 ‘피크 아웃(peak-out)’ 시나리오를 경계하며 실현 이익을 우선시했다.
대형주 펀드가 핵심 타깃이 됐다. 대형주 펀드(Large-cap)에서만 341억9,000만 달러가 빠져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형주 펀드는 15억8,000만 달러가 빠져나간 반면, 소형주 펀드에는 5,000만 달러가 소폭 유입됐다.
섹터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4주 만에 처음으로 12억4,00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고, 이 중 기술 섹터 펀드에서만 28억4,000만 달러가 이탈했다. 기술주 집중 편중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드러난 셈이다.
“S&P 500의 선행 주가수익비율(Forward P/E)이 22.6배로 지난 20년 기준 상위 1% 구간에 있다. — 마크 헤이펠레(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
헤이펠레 CIO는 “최근 급등장 이후 조정(Consolidation)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수익비율(P/E)은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고평가’ 논란이 커진다.
채권·현금 흐름 엇갈리다
주식이 흔들리는 사이 미국 채권형 펀드에는 73억3,000만 달러가 22주 연속 유입됐다. 특히 단·중기 투자등급 회사채와 국채·모기지 등 일반 과세채권이 각각 15억9,000만 달러, 11억4,000만 달러 씩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방채(Municipal Debt)에도 10억4,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반면 머니마켓펀드에서는 236억5,000만 달러가 빠져나가 3주 연속 순매수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식·채권 간 자금 재배치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통찰
필자는 “이탈 규모 자체보다 종목·자산별 온도 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대형 기술주의 고밸류에이션이 부담이지만, 소형주·채권으로의 자금 분산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성장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더라도 방어적 섹터·듀레이션 조절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초보 투자자라면 P/E, Forward P/E처럼 생소할 수 있다. P/E는 ‘Price ÷ Earnings’로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며, Forward P/E는 현재 주가를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값비싼 주식’으로 해석된다.
결국 금리·실적·경제지표가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4분기 실적 시즌과 연준의 추가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며,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