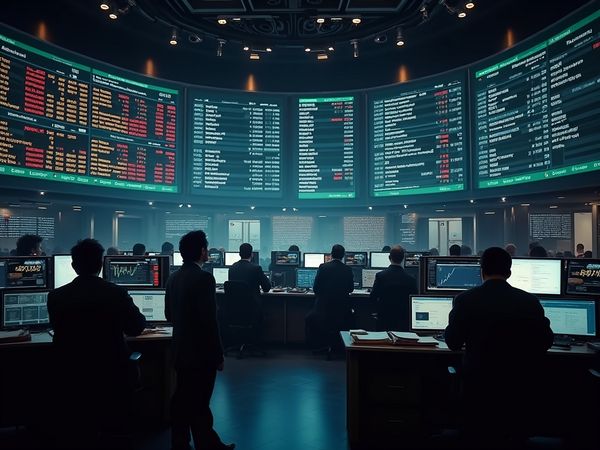머리말: 붐·버블·변곡점—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2025년 10월, CNBC·나스닥닷컴·RTT뉴스 등 주요 매체가 전한 헤드라인을 한데 모아 보면 ‘AI 투자 열기’만큼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없다. ‘1,300개 AI 스타트업 가치 1억 달러 돌파’, ‘OpenAI·엔비디아 1조 달러 장기 계약’, ‘기업 Capex(자본적 지출)의 절반이 AI로 이동’… 수치를 나열하기만 해도 현기증이 돌 정도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에는 ‘거품’·‘닷컴 데자뷔’·‘부채 의존 구조’ 같은 불길한 단어가 웅크리고 있다.
필자는 이 거대한 투기·투자 파동이 장기(10년 이상)에 걸쳐 미국 증시뿐 아니라 실물 경제, 더 나아가 통화·에너지 정책 프레임까지 어떻게 바꿔 놓을지를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한다. 모든 논의의 중심축은 “AI 초과투자(capex overshoot)가 금융·실물 시스템에 어떤 경로로 충격—혹은 도약—을 전파할 것인가”다.
1. 데이터 점검: ‘AI 붐’을 말하는 숫자들
| 지표·사례 | 최근 수치·팩트 | 출처 |
|---|---|---|
| AI 스타트업 1억 달러 이상 기업 수 | 1,300개 (2025.10 기준) | CNBC |
| AI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 498개 | CNBC |
| 글로벌 AI 지출 전망 | 2025년 3,750억 달러 → 2026년 5,000억 달러 | UBS 보고서 |
| 빅테크 Capex 중 AI 비중 | 50% 내외 (MS·META·AMZN 등) | ING PB 인터뷰 |
| GPU 서버용 전력 소비 예상 증가율 | 연평균 26% (2024~2030) | IEA |
| 월가 펀드매니저 서베이 ‘AI 버블 최대 리스크’ 응답률 | 33% (전월 10% → 3배 급증) | BofA Global FMS |
위 표는 ‘규모’와 ‘속도’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필자는 특히 전력 소비 예측치를 주목한다. 반도체의 집적도·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더라도 초대형 파라미터 모델 학습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AI 인프라 확대 = 전력·냉각·부지·규제 등 전방위 공급망 재편을 의미한다.
2. 거품 논쟁 세 갈래: 낙관·회의·중도파
2-1. 낙관론 ― “이번에는 다르다”
- Larry Fink(블랙록): “GPU·HVAC·전력망까지 포함한 투자는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 Anneka Treon(ING PB): “실제 현금이 설비 투자로 변환되고 있으며, 기업 ROIC는 역사적 평균을 상회한다.”
- Pat Gelsinger (전 인텔 CEO): “거품이어도 붕괴까지 ‘수년’ 남았다—그간 실물 혁신이 수익성을 견인할 것.”
2-2. 회의론 ― “닷컴 버블 2.0”
- Jared Bernstein (前 백악관 CEA 의장): “OpenAI 매출 130억 달러 vs 데이터센터 투자 1조 달러, 극단적 불일치.”
- Ben Inker (GMO): “현금흐름 부족 스타트업이 순환매출·엔비디아 지분 교환으로 생존—클래식 버블 징후.”
- Howard Marks (오크트리): “심리적 광기가 아직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붕괴 전 야금야금 과열’ 시나리오.”
2-3. 중도파 ― “거품과 혁신이 공존”
필자 역시 중도파 입장이다. 99년 닷컴·08년 서브프라임과 달리, AI 인프라는 설비 경제(physical economy)—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냉각, 부지—를 동반한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현금이 토목·전기 공사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거품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ROI 검증 지연과 레버리지 의존 구조는 고전적 버블의 공통 DNA다.
3. 레버리지·자본 조달 구조 분석
CNBC 인용에 따르면, 일부 빅테크와 AI 유니콘들은 데이터센터 건설 자본재(CAPEX)의 30~40%를 회사채·전환사채로 조달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인터넷 기업이 증자(주식 발행)에 의존했던 구조와 다르다. 부채 비중이 높다는 점은 금리 민감도(듀레이션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표 1 | 선도 기업 자본구조 비교(2025E)
| 기업 | 순차입/EBITDA | Capex/매출 | AI 투자 비중 | 금융비용/매출 |
|---|---|---|---|---|
| 엔비디아 | 0.4배 | 12% | 80% 이상 | 2% |
| 마이크로소프트 | 0.6배 | 14% | 50% 내외 | 1.3% |
| OpenAI (비상장) | 3.8배* | >100%* | 100% | — |
| AI 스타트업 평균(498社) | 5.2배 | 120%* | 100% | — |
*주: 비상장사는 추정치, Capex/매출 >100%는 적자 상태에서 차입·지분투자로 설비를 확대 중임을 의미.
즉, 대차대조표가 견실한 메가캡은 금리 6% 시대에도 방어력이 높지만, 스타트업 레이어는 금리 상승·유동성 경색 시 급격한 가치 재평가(리레이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4. 에너지·전력·기후 변수: ‘AI 전력 쇼크’ 논쟁
4-1. 전력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70TWh(전체 소비전력의 5%) 수준이다. AI 특화 GPU 클러스터 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 700TWh(비중 11%)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텍사스·플로리다·뉴욕 3개 주 연간 가정용 전력 소비 총합과 맞먹는 규모다.
4-2. 정책·규제 리스크
- 탄소배출권·RE100: 빅테크는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로 대응 중이나, 전력망 투자 속도 < AI 수요 증가 속도.
- 그리드 보조 서비스 확대: 전력청·FERC가 데이터센터에 수요반응(DR)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료 상승 리스크.
- 중국·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쟁: AI 인프라 전력원에서 탄소를 포함하면 국경세 부담.
4-3. 장기 투자 기회와 함정
친환경 전력·냉각·배터리·HVAC 산업은 구조적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력요금 급등이 클라우드·AI 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경우, 수요 탄력성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5. 시장 밸류에이션 시나리오 (2025~2030)
그림 1 | 밸류에이션 밴드 시뮬레이션
- 베이스라인(60%) – S&P 500 EPS 성장 8% & 멀티플 19x 유지: 연평균 수익률 7~8%.
- 낙관 시나리오(25%) – AI ROI 가시화·금리 하락: EPS 12% & 멀티플 22x → 연 12~14%.
- 버블 붕괴(15%) – 부채 비용 급등·규제 쇼크: EPS 3% & 멀티플 14x → 연 −3~0%.
주목할 점은 베이스라인과 낙관 시나리오가 ‘멀티플 디스카운트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금리·에너지·규제가 동시에 악화되면 버블 붕괴 확률(15%)이 현실화될 수 있다.
6. 섹터별 장기 포지셔닝 가이드
| 섹터 | 구조적 수혜 요인 | 핵심 리스크 | 전략 |
|---|---|---|---|
| AI 반도체 (GPU·ASIC) | 모델 파라미터 급증 | 재고 사이클·중국 제재 | 톱티어 중심 코어 보유 |
| 데이터센터 REIT | 콜로케이션 수요 증가 | 전력 단가·금리 | 장기 PPA 확보기업 선별 |
| 전력·유틸리티 | 수요 급증·요금 인상 | 규제 상한·탄소세 | 규제 회수율(ROE) 높은 지역 선택 |
| 친환경 인프라 (HVAC·냉각) | 효율 투자 의무화 | 기술 대체 속도 | 모듈화·스케일업 업체 |
| 대체육·차세대 식품 | AI 푸드테크·새로운 수요 | 가격·원가·버블 | 플랫폼·유통 계약 확대 기업 |
7. 투자자 행동 프레임워크: 3-L 모델
- Liquidity (유동성) – 부채·금리·신용스프레드 동향을 매크로 레벨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 Latency (시차) – Capex → 매출화까지 걸리는 18~36개월의 타임라그를 고려, “주가 선행 vs 실적 확증” 균형을 맞춘다.
- Layering (분산계층) – AI 코어(반도체)-전력-애플리케이션-실수요 산업으로 수직 밸류체인에 걸친 ETF·개별주 레이어를 구축한다.
8. 결론: ‘전력·금리·규제 트릴레마’를 돌파할 것인가
AI에 대한 기대가 거품인지 혁신인지—답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다만 ①투자가 실물 자본재로 이행되고 있고, ②에너지·전력·반도체 등 필수 인프라의 병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③금리·탄소·규제라는 3대 외생변수가 투자 회수 기간과 수익성을 가를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장기 투자자는 다음 세 질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1) AI 인프라 수요 곡선이 전력·규제 공급곡선보다 빠르게 상승할 때, 가장 먼저·가장 크게 충격을 받을 자산은 무엇인가?
2) 금리 상승기에도 자본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현금창출력을 가진 기업·섹터는 어디인가?
3) 거품이 일부 꺼져도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데이터 해자로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보유한 플레이어는 누구인가?
다음 10년, AI는 분명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 = 투자 가치 보존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치·금융·에너지·노동시장의 다차원 충격을 견뎌낼 ‘내성’을 갖춘 포트폴리오만이 거품의 사다리를 타고 혁신의果를 수확할 수 있다.
ⓒ 2025. 이중석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