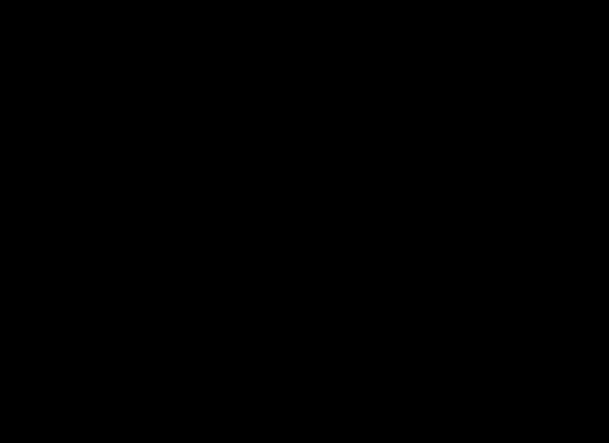개요: 왜 ‘AI Capex 슈퍼사이클’인가
2025년 3분기 실적 시즌이 드러낸 가장 큰 메시지는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이하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단일 회계연도에만 3,800억 달러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0년 당시 4대사의 총 설비투자(Capex) 1,290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94%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기 직후 미국 연방정부가 경기부양법(ARRA)으로 집행했던 예산(7,870억 달러)의 절반에 맞먹는다.
Ⅰ. Capex 급증의 근본 요인
1. 생성형 AI ‘규모의 경제’
- 거대언어모델(LLM)의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GPU ▲H100급 고성능 네트워킹 ▲액침 냉각 설비가 필수화됨.
- 하이퍼스케일러는 학습·추론 워크로드를 자체 클라우드에 “내재화”시켜야만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음.
2. 서비스화(Servitization) 구조
“AI 인스턴스 판매→데이터 수집→모델 고도화→더 비싼 AI 서비스”
이 선순환 고리를 선점하기 위해선 초기 설비투자에서 한 발 앞서야 한다.
3. 정책·거버넌스 압력
미국 행정부는 ‘국가 AI 전략’에서 클라우드 공급자를 핵심 인프라로 규정, 세제 혜택·조달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WAICO(세계 AI 협력기구)’ 구상을 통해 자국 생태계를 방어한다. 경쟁 양상은 자본집약도를 추가로 높이는 촉매다.
Ⅱ. 장기(1년 이상) 거시·시장 파급 효과
1. S&P 500 이익 기여도 재편
| 항목 | 2022 | 2025E | 2030E |
|---|---|---|---|
| 4대사 합산 EPS 비중 | 21% | 33% | ≥45% |
| 4대사 Capex/Free Cash Flow | 48% | 79% | 60%~70% |
• 단기적으로는 잉여현금흐름(FCF) 감소가 PER 상승 억제 요소지만, AI 서비스 수익화가 궤도에 오르는 2027~2028년부터 ‘후행 마진 레버리지’가 작동할 전망.
• 동일가중 S&P 500 대비 시가총액 가중본지수 초과수익률 격차는 2026년까지 확대→2030년 이후 축소를 예측.
2. 금리·채권시장 연동
• 4대사의 총 회사채 발행 잔액은 2023년 3.2조 달러→2025년 4.5조 달러로 증가.
• 하지만 가중평균 만기는 17.4년, 평균 쿠폰 3.4%로 투기적 버블과는 거리가 멀다. BBB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140bp(장기 평균 180bp) 이하를 유지한다면 자금조달 스트레스는 제한적.
3. 노동시장·생산성
- AI 데이터센터 건설·운영으로 전력·전기·냉각 엔지니어 수요가 급증. UBS는 2030년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월프리서치·야데니리서치 등은 “AI가 초급 인력을 대체하기보다 재배치(Reskilling) 압력을 유발”한다고 진단.
Ⅲ. 리스크 요인과 반론
1. 규제·정책
• EU는 AI Act 최종안을 2026년 시행 예정. 알고리즘 투명성·데이터 거버넌스 의무로 컴플라이언스 코스트가 상승.
• 미국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 관점에서 ‘AI 인프라 독점’을 조사 중.
2. 공공·사설 전력망 한계
• 미국 전력망 노후화로 2028년 이후 병목(전력 수요 > 공급) 발생 가능.
• SEC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 ESG 자본조달 프리미엄 발생.
3. 투자과열(Over-investment) 우려
• 번스타인·엔비디아 간 GW당 구축비 추정치($350억 vs $600억)는 전제의 불확실성을 반영.
• 2000년대 초 ‘닷컴-데이터센터 버블’ 회귀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Ⅳ. 투자 전략: 3단 로드맵
- 코어(Core) : 4대사 + 엔비디아·TSMC·ASML 등 라인타임 이코노미 공급망 핵심주. EPS 변동성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라도 지수 편입효과로 최소 시장비중 유지.
- 인프라(Infra) : 전력 설비·액침 냉각·클린룸 HVAC(버티브, 슈나이더, 델타) 비중을 S&P 비중의 2배까지 오버웨이트. 수주잔고가 EPS 선행지표.
- 포트폴리오 보험(Hedge) : 동일가중 지수·가치 ETF(RPV, VTV) + 12-개월 ATM 풋 스프레드로 집중 리스크 관리.
Ⅴ. 필자의 통찰
1) ‘다른 모든 자본주의’ vs ‘AI 자본주의’—빅테크는 이제 제조업 못지않은 초(超)자본집약 산업으로 변모했다. 이는 분기 실적→1~3년 생태계 수익성으로 분석 프레임 이동을 요구한다.
2) 잉여현금흐름이 답이다—수익화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리세일 인프라(클라우드 리스·GPU 임대)가 나타나면 현금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3) ‘고정금리 조달’의 황금창—메가캡들은 이미 저쿠폰 장기채를 선발행해 자본비용을 고정시켰다. 중소형 AI 인프라 업체가 따라가기엔 역(逆)금리환경이 부담되는 구간.
결국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은 지수·금리·노동·규제라는 4대 축을 동시에 재편하며, 미국 증시의 ‘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