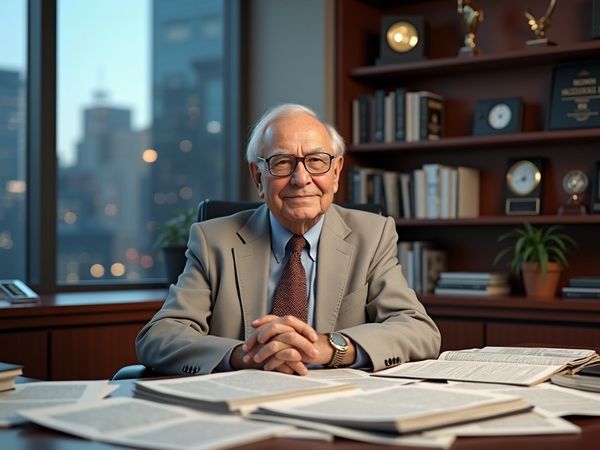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 티커 BRK.A·BRK.B)가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기 회사의 지배주주지분 기준 순이익은 307억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62억5,100만 달러 대비 약 45억 달러(17%) 증가했다.
2025년 11월 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주당 기준(Class A) 순이익은 $21,413로 지난해 동일 분기의 $18,272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버크셔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재무 지표
• Earnings Before Income Taxes(세전이익): 381억500만 달러(전년 325억800만 달러)
• Investment Gains(투자이익): 219억3,900만 달러(전년 205억1,400만 달러)
• Operating Earnings(영업이익): 134억8,500만 달러(전년 100억9,000만 달러)
• Total Revenues(총수익): 949억7,200만 달러(전년 929억9,500만 달러)
위 수치는 모두 GAAP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 늘어난 2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등 대형 포지션의 주가 상승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철도·에너지·보험 등 계열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세 역시 견조해, 순수 투자수익에 편중되지 않은 다각화 모델의 강점을 재확인했다.
Class A·B 주식 차이 설명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Class A(BRK.A)와 Class B(BRK.B) 두 종류로 나뉜다. Class A는 1주당 가격이 수십만 달러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불리며, 의결권도 더 높다. Class B는 유동성과 소액 투자를 위해 1996년 도입됐고, Class A 1주가 Class B 1,500주(현재 1/10,000비율로 분할 조정)와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주당 순이익 21,413달러’는 Class A 기준임을 유념해야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포트폴리오 및 전략적 의의
버크셔는 보험·재보험(가이코, 내셔널인뎀니티), 산업재·인프라(BNSF 철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소비재·서비스(데어리 퀸, 프루트 오브 더 룸) 등 8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한다. 이러한 다각화 구조가 경기 변동기에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며, 워런 버핏 특유의 장기 가치투자 철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두고 “보험 언더라이팅 수익이 개선되고, 재보험 부문의 Combined Ratio(손해율+사업비율)가 안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 속에 운용 현금성 자산의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
- 현금 보유고: 2025년 2분기 말 1,470억 달러였던 현금 및 단기투자 자산이 3분기 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따라 M&A 가능성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 자사주 매입: 버크셔는 2022~2024년 약 350억 달러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매입 단가와 규모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다.
- 보험 손실 위험: 기후변화로 인한 허리케인·산불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4분기에 보험료 인상 압력과 손해율 변동 폭을 주시해야 한다.
한편, 기사 말미에 첨부된 “본 기사의 견해와 의견은 작성자의 것이며 나스닥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미국 언론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통상적 면책조항으로, 기업 또는 제3자의 법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결론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5년 3분기에도 매크로 환경 악화 우려를 딛고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현금 창출력’과 ‘투자 포트폴리오 효과’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보험업 손해율, 대규모 인수합병(M&A) 여부가 실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