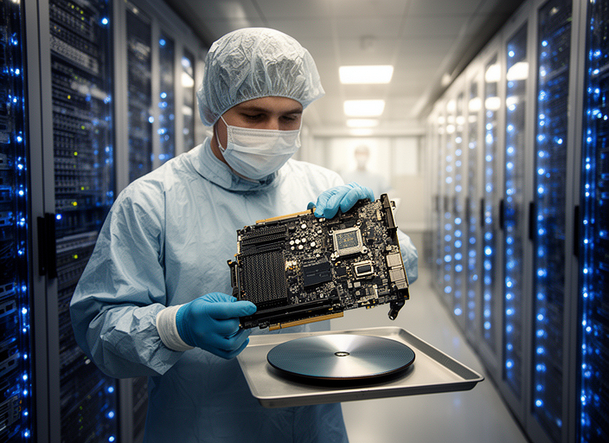1. 문제 제기: 7개월 만에 ‘반짝’ 회복된 거래, 그 너머의 구조적 병목
지난 9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5% 늘며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처럼의 ‘플러스’ 수치였지만, 이는 연 406만 건에 불과한 ‘찻잔 속 미풍’에 그쳤다. 2019년 팬데믹 이전 평균(540만 건)을 여전히 25% 넘게 밑돈다.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중간가격은 41만 5,200달러로 또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공급 절벽과 고금리가 동시에 작동하며 ‘거래 절벽 & 가격 고착’이라는 기형적 조합이 고착되는 양상이다.
2. 데이터로 본 ‘병목 구조’
2-1) 재고 절대 부족
- 9월 재고 155만 호, 현 판매 속도로 4.6개월치에 불과. 안정 구간(6개월) 대비 25% 부족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2개월치 재고와 대조적
- 신축 단독주택 착공은 팬데믹 이후 반등했으나 2000~2005년 평균 대비 아직 ‑15%
2-2) 금리에 묶인 ‘락-인 효과’
| 대출 시점 | 30년 고정 금리 | 차주 비중 |
|---|---|---|
| 2019년 이전 | 3.5% 이하 | 37% |
| 2020~2022년 | 2.5~3.5% | 44% |
| 2023년 이후 | 6.0% 이상 | 19% |
기존 주택 소유주 4명 중 3명은 3% 안팎 초저금리에 고정되어 있다. 새 집으로 이주하면 대출 금리가 두 배가 되므로 ‘움직일 이유’를 잃는다. 이른바 금리 락-인(lock-in) 현상이다.
2-3) 인구·세대 구조
1989~1996년생 ‘밀레니얼 B코호트’ 약 3,200만 명이 평균 결혼·출산 연령에 진입했다. 연간 추가 수요 140만 호가 발생하지만, 공급 능력은 110만 호 수준에 머문다.
3. 구조적 병목이 왜 인플레이션 상단을 고착시키는가
3-1) CPI 바스켓 내 ‘주거비(쉘터)’ 가중치 34%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쉘터 항목은 무려 3분의 1을 차지한다. 소유주거비(OER)와 실제 임차료(Rent) 모두 지연 효과(lag)가 9~12개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024~2025년 계약된 고가 모기지가 2026년까지 CPI를 밀어올릴 여지를 제공한다.
3-2) 주거비 상방→임금 요구→서비스 물가 2차 파고
- 높은 주거비는 가처분소득을 잠식해 임금 인상 요구를 자극
- 서비스업체는 인건비를 가격에 전가하며 근원 서비스 CPI를 상승
- 연준이 목표로 삼는 PCE 물가에서도 서비스 가중치는 55%에 달함
4. 정책·금리·시장에 미칠 5대 장기 파급
4-1) 연준의 ‘최종 금리 하방’ 제한
쉘터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한다면, 연준은 2026년 이후에도 정책금리를 3% 이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포워드 커브 전반의 불(不)평형을 고착시켜 장기채 수요를 제약, 주가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4-2) 재정·정책 수단의 주택 집중
◆ 민주·공화 양당 모두 2026년 세제 변혁 공약에서 ‘건설 인센티브,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핵심 의제로 명시
◆ 지방정부 Zoning 완화 움직임 확대 → 그러나 님비(NIMBY) 저항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확대 속도는 제한적
4-3) 주거 관련 섹터 초과 수익
- 소형 주택건설 ETF(ITB) vs. 리츠 REITs 성과 분기점 확대
- 모기지 서비스(MS)·주택 기술(Home-Tech)·단독 임대(SFR REIT) 분야가 신(新) 모멘텀 후보
4-4) ‘뉴노멀’ 소비 패턴: K-자형 심화
저소득층은 주거비 비중이 50%에 육박, 가처분소득 축소→필수 소비만 유지. 반면 고소득층은 주택 자산 상승이 역(逆)부의효과를 제공, 고가 레저·여행·럭셔리 소비를 지속한다.
4-5) 소셜·정치 리스크 증폭
주택 접근성 악화는 세대·계층 갈등을 격화한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고비용 주는 주택보조금,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중서부 일부 주는 영구 재산세 한도를 도입하며 ‘주거 복지 연방주의’가 심화될 전망이다.
5. 전망 시나리오 & 정책·투자 로드맵
Base Case (확률 55%)
• 30년 모기지금리 2025년 말 5.8%→2026년 말 5.2%
• 주택 착공 130만 호 내외, 가격 상승률 연 4%
• 쉘터 CPI YoY 3.0~3.3% → Fed 최종금리 3.25%
Upside Case (확률 25%)
• 인플레 감축법(IRA)·인프라법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급증
• 착공 150만 호, 가격 상승률 6%
• REIT·건자재 주가 추가 20% 상승
Downside Case (확률 20%)
• 미·중 무역 마찰 재점화→건자재 가격 급등
• 모기지금리 6.5% 고착, 착공 110만 호로 후퇴
• 쉘터 CPI 4% 고정→연준 재긴축·경기 침체 위험 증가
6. ‘이중석’s Insight
1️⃣ 주택은 인플레이션의 ‘심장’이다 – 쉘터 가중치 34%는 물가의 장기 방향을 규정한다. 연준은 금리를 낮춰 수요를 부양할 수도, 높여 가격을 억제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2️⃣ 공급 혁신이 없으면 ‘60-70년 주기’ 부동산 사이클 재현 – 1940년대 전후 베이비붐·GI빌, 1980년대 레이건 감세기 때와 같은 공급 폭증이 없다면 이번 사이클은 더 길고 더 비싸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 금융시장은 ‘장기 구조 테마’에 베팅 – ITB·SFR REIT·건설자재·모기지서비스 기업은 ‘찻잔 속 미풍’이 아닌 ‘해일’의 초입에 있다. 단, 다운사이드에는 건자재 투입가격·노동비 인플레가 잠복해 있다.
4️⃣ 정책영역의 승자와 패자 – 통합 인·허가 시스템(State-level One-stop)과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한 주(州)가 인구 순유입을 통해 장기 세수(稅收)를 선점할 것이다. 반면 규제 완화에 실패한 대도시권은 탈(脫)도심·탈주(州) 현상이 심화돼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5️⃣ ESG 투자 프레임에도 변곡점 – 에너지 효율·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녹색 주택이 탄소배출·사회적임팩트(S) 측면에서 ‘Winners’로 부상한다.
7. 결론
주택은 더 이상 단순 자산이 아니다. ① 인플레이션 경로, ② 금리 정책, ③ 소비 구조, ④ 정치·사회 갈등을 관통하는 거시 패러다임의 핵심 변수다. 공급 병목이 장기화될수록 물가 상한이 상승하고, 이는 ‘고금리-고자산가치’라는 기묘한 공존 상태를 연장시킨다. 투자자·정책당국 모두 “주택=심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병목 완화·비용 전가·자산 방어 전략을 세밀히 설계해야 할 터다.